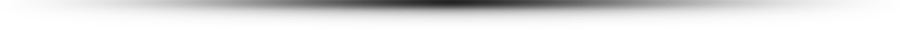남자 여자 따로 먹던 밥상, 20년 만에 합치다
오마이뉴스
여성
0
5,517
2018.10.31 18:34
작년 이맘때쯤 외조부모님 1주기 합동 제사는 필자의 집안에서 마지막으로 치른 가장 큰 제사였다. 어머니는 그 당일 퇴근한 몸을 이끌고 유과를 직접 만들고, 외조부모님이 좋아하셨던 반찬들을 하느라 새벽 세 시까지 요리를 하셨다. 나 역시 업무 파견 일을 조정하여 이틀 동안 서울-부산-강릉-서울을 이동하는 극한의 스케줄을 소화해야 했다.
여성이 제사상을 다 차리면 절을 하라는 말을 집안의 제일 큰 남자 어르신이 외친다. 외조부모님 딸인 우리 엄마보다 '더 먼 촌수'인 외할아버지 여동생의 남편이 재빠르게 앞서 서고, 이를 이어 나의 두 외삼촌(외조부의 아들), 외할아버지의 사촌 아들들이 섰다. 그 뒤를 뭉그적거리며 외숙모(외삼촌의 아내)와 엄마, 남은 여성들이 섰다. 뛰놀던 아이들도 '자연스레' 질서를 따라 여자 아이들은 뒤에 남자 아이들은 앞에 섰다.
눈물이 울컥 차올랐다. 그래 우리 집은 보수적이었지. 사촌여동생의 등을 부추겼다. "앞에 가서 서~" 말괄량이인 초등학생 1학년인 내 여사촌도 그 자리가 자신의 자리가 아니라는 걸 알았다. 내가 잡은 손을 거부했다. 그제야 나는 엄마 손을 잡고, 하루종일 요리했을 외숙모의 손을 잡고 사이를 비집고 들어갔다.
어른들이 그 안으로 비집고 들어가니 사촌 여동생들도 슬그머니 옆에 섰다. 아재는 "그래, 느그가 앞에 서는 게 맞지" 하며 비켜서 주셨다. 그렇지만 외삼촌은 "그렇게 뒤에 서는 게 억울하더나. 앞에서나 뒤에 서나 똑같다"라는 주옥같은 말을 남기셨다.
안방에서 절을 할 때는 등으로 견고한 벽을 쌓던 그 남자들이 제사가 끝나면 재빠르게 마루에 밥상을 펴고 안방을 여자에게 내준다. 그러면 여자들은 고기를 자르고 생선을 바르고 그릇에 요리를 덜어낸다.
우리 집은 여전히 여자, 남자 밥 먹는 테이블은 달랐다. 남자들은 마루에서 서열대로 위에서부터 앉았고 맨 아래 테이블에는 아이들이, 아예 숙모들과 엄마는 부엌에서, 할머니들은 안방에서 식사하셨다.
나는 안방에서 고모할머니들께 할아버지들과 같은 테이블에서 식사하라고 권했다. 남자들 먹일 생선과 고기들을 자르던 도마와 주변에 널부러져 펴있던 신문지 위가 "편하시다"라고 손사래를 치던 고모 할머니들의 등을 거의 떠밀다시피 해서야 할머니들이 마루로 나오셨다.
남정네들의 그 견고한 엉덩이를 비집고 자리를 만들어 드렸다. 그곳에서 할머니들은 자신의 사촌오빠들과 웃으며 그들의 생 처음 제사 때 같은 식탁에 앉아 밥을 먹었다. 나의 생 20년 만에 이뤄낸 일이 그들의 생에서는 8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다. 그것도 나의 외조부님이 다 돌아가고 나신 뒤에서야.
그 등을 떠밀고는 나는 홀로 앉아 과일을 깎아 날랐다. 나의 할머니들이 평생에 걸쳐 이뤄내지 못한 일들을 같이 이뤄냈다는 벅찬 마음과 그들의 자리를 위해 내가 다시 노동해야 하는 서글픔 속에서 나는 위 사진을 한 장 찍었다.
성차별은 고루한 이야기?
이 이야기를 하면 많은 이들이 놀라고, 아직도 그런 집이 있냐고 물어본다. 이러한 반응은 성차별이 많이 완화되었다는 근거로도 사용되는 듯하다. 따라서 필자의 경험은 소수의 경험이고 보편적으로는 통용되기 힘든 시대가 되었다며, 성평등 시대에 도래했다는 주장을 펼치는 이들도 있다.
그러나 과연 그런가? 여전히 61.9%가 시댁을 먼저 방문하고 4.2%만이 친정을 먼저 방문하고 시댁을 방문한다. 시댁만을 방문하는 경우인 5.4%보다도 적은 현상이라는 것이다.
우리 집안만 하더라도 외조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전통적인 성차별 문화가 사라지고 있는 건 사실이다. 제사도 줄었고 하더라도 훨씬 간소화되었다. 그렇지만 이것이 여성과 남성의 화합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필자의 외할머니는 마지막까지 안방 신문지 위에서 고운 한복을 입고 생선과 고기를 잘라야만 했다. 나는 매년 어린 사촌 동생들을 돌봐야 했고 서빙을 했으나 나의 사촌오빠는 쉬며 게임을 하고 밥을 먹었다.
여기에 대한 성역할에 대한 반성 없이 단순히 현상만 사라진다고 해서 우리 집에 남아있는 성차별 인식은 사라지지 않는다. 내가 맞섰던 그 위계 질서에 삼촌이 내게 "그렇게 뒤에 서는 게 억울하더나. 앞에서나 뒤에 서나 똑같다"라는 말을 끝으로 그는 그 일에 대해서 더는 반성할지 하지 않을지는 모르는 일이다.
나의 한걸음에 함께해준 고모할머니, 엄마, 외숙모, 여동생들의 용기로 마지막 제사에서 약간의 심리적 위안을 얻었지만 그럼에도 나는 큰삼촌과 돌아가신 외할아버지와 화해하지 못한 채로 끝나버렸다.
이제 우리 집안의 제사는 서서히 그 효력을 잃어갈 것이고 간소화될 것이고 실제로 간소화되어가고 있다. 그러나 여성차별에 대한 사회적 반성과 자각 없이는 언제든 새로운 형태의 여성차별이 등장할 수 있다. 성차별 문화에 익숙해진 사람들은 다른 장소에서 다른 형태의 여성차별에 둔감하게 살아갈 수 있다.
여성 문제는 여성만이 바뀌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남성과 함께해나가는 문제다. 이 문제에 있어 지금 한국에서 여성과 남성이 인지하는 여성인권의 온도 차는 너무나 극명하다.
이를 위의 왕따의 사례로 연관 지어서 생각해보면 이 온도 차는 쉽게 이해될 수 있다. 왕따는 그 누구도 자신을 괴롭히지 않는 상황에서도 정신적 피해와 두려움을 느낀다. 하교한 상황에서도 내일 등교를 걱정하고 타인이 불편해 할 만한 행동을 모두 계산하며 심리적인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피해는 존재하지만, 그 어떤 가해도 존재하지 않는 순간이 있을 수 있다.
이게 여성 차별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당사자가 아닌 남성들은 더더욱 이 소극적 차별에 자신이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기 어려운 구조에 있다. 그렇기에 여성과 남성의 성차별에 대한 인식이 다른 것이다. 사람들과 일조했던 명절의 성차별적 전통이 많이 줄어가고 있다고 해서, 여성차별이 해결되어 가고 있는 것인가?
잘못된 과거를 단순히 덮어두고 없애버리며 더 이상 이 현상이 없다고 치부해버려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에는 또다시 새로운 차별의 현상들을 자리잡게 할 것이다. 과거와 전통을 바탕으로 미래를 위해 논의하고 나아가야 할 때다.
여성이 제사상을 다 차리면 절을 하라는 말을 집안의 제일 큰 남자 어르신이 외친다. 외조부모님 딸인 우리 엄마보다 '더 먼 촌수'인 외할아버지 여동생의 남편이 재빠르게 앞서 서고, 이를 이어 나의 두 외삼촌(외조부의 아들), 외할아버지의 사촌 아들들이 섰다. 그 뒤를 뭉그적거리며 외숙모(외삼촌의 아내)와 엄마, 남은 여성들이 섰다. 뛰놀던 아이들도 '자연스레' 질서를 따라 여자 아이들은 뒤에 남자 아이들은 앞에 섰다.
눈물이 울컥 차올랐다. 그래 우리 집은 보수적이었지. 사촌여동생의 등을 부추겼다. "앞에 가서 서~" 말괄량이인 초등학생 1학년인 내 여사촌도 그 자리가 자신의 자리가 아니라는 걸 알았다. 내가 잡은 손을 거부했다. 그제야 나는 엄마 손을 잡고, 하루종일 요리했을 외숙모의 손을 잡고 사이를 비집고 들어갔다.
어른들이 그 안으로 비집고 들어가니 사촌 여동생들도 슬그머니 옆에 섰다. 아재는 "그래, 느그가 앞에 서는 게 맞지" 하며 비켜서 주셨다. 그렇지만 외삼촌은 "그렇게 뒤에 서는 게 억울하더나. 앞에서나 뒤에 서나 똑같다"라는 주옥같은 말을 남기셨다.
안방에서 절을 할 때는 등으로 견고한 벽을 쌓던 그 남자들이 제사가 끝나면 재빠르게 마루에 밥상을 펴고 안방을 여자에게 내준다. 그러면 여자들은 고기를 자르고 생선을 바르고 그릇에 요리를 덜어낸다.
우리 집은 여전히 여자, 남자 밥 먹는 테이블은 달랐다. 남자들은 마루에서 서열대로 위에서부터 앉았고 맨 아래 테이블에는 아이들이, 아예 숙모들과 엄마는 부엌에서, 할머니들은 안방에서 식사하셨다.
나는 안방에서 고모할머니들께 할아버지들과 같은 테이블에서 식사하라고 권했다. 남자들 먹일 생선과 고기들을 자르던 도마와 주변에 널부러져 펴있던 신문지 위가 "편하시다"라고 손사래를 치던 고모 할머니들의 등을 거의 떠밀다시피 해서야 할머니들이 마루로 나오셨다.
남정네들의 그 견고한 엉덩이를 비집고 자리를 만들어 드렸다. 그곳에서 할머니들은 자신의 사촌오빠들과 웃으며 그들의 생 처음 제사 때 같은 식탁에 앉아 밥을 먹었다. 나의 생 20년 만에 이뤄낸 일이 그들의 생에서는 8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다. 그것도 나의 외조부님이 다 돌아가고 나신 뒤에서야.
그 등을 떠밀고는 나는 홀로 앉아 과일을 깎아 날랐다. 나의 할머니들이 평생에 걸쳐 이뤄내지 못한 일들을 같이 이뤄냈다는 벅찬 마음과 그들의 자리를 위해 내가 다시 노동해야 하는 서글픔 속에서 나는 위 사진을 한 장 찍었다.
성차별은 고루한 이야기?
이 이야기를 하면 많은 이들이 놀라고, 아직도 그런 집이 있냐고 물어본다. 이러한 반응은 성차별이 많이 완화되었다는 근거로도 사용되는 듯하다. 따라서 필자의 경험은 소수의 경험이고 보편적으로는 통용되기 힘든 시대가 되었다며, 성평등 시대에 도래했다는 주장을 펼치는 이들도 있다.
그러나 과연 그런가? 여전히 61.9%가 시댁을 먼저 방문하고 4.2%만이 친정을 먼저 방문하고 시댁을 방문한다. 시댁만을 방문하는 경우인 5.4%보다도 적은 현상이라는 것이다.
우리 집안만 하더라도 외조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전통적인 성차별 문화가 사라지고 있는 건 사실이다. 제사도 줄었고 하더라도 훨씬 간소화되었다. 그렇지만 이것이 여성과 남성의 화합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필자의 외할머니는 마지막까지 안방 신문지 위에서 고운 한복을 입고 생선과 고기를 잘라야만 했다. 나는 매년 어린 사촌 동생들을 돌봐야 했고 서빙을 했으나 나의 사촌오빠는 쉬며 게임을 하고 밥을 먹었다.
여기에 대한 성역할에 대한 반성 없이 단순히 현상만 사라진다고 해서 우리 집에 남아있는 성차별 인식은 사라지지 않는다. 내가 맞섰던 그 위계 질서에 삼촌이 내게 "그렇게 뒤에 서는 게 억울하더나. 앞에서나 뒤에 서나 똑같다"라는 말을 끝으로 그는 그 일에 대해서 더는 반성할지 하지 않을지는 모르는 일이다.
나의 한걸음에 함께해준 고모할머니, 엄마, 외숙모, 여동생들의 용기로 마지막 제사에서 약간의 심리적 위안을 얻었지만 그럼에도 나는 큰삼촌과 돌아가신 외할아버지와 화해하지 못한 채로 끝나버렸다.
이제 우리 집안의 제사는 서서히 그 효력을 잃어갈 것이고 간소화될 것이고 실제로 간소화되어가고 있다. 그러나 여성차별에 대한 사회적 반성과 자각 없이는 언제든 새로운 형태의 여성차별이 등장할 수 있다. 성차별 문화에 익숙해진 사람들은 다른 장소에서 다른 형태의 여성차별에 둔감하게 살아갈 수 있다.
여성 문제는 여성만이 바뀌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남성과 함께해나가는 문제다. 이 문제에 있어 지금 한국에서 여성과 남성이 인지하는 여성인권의 온도 차는 너무나 극명하다.
이를 위의 왕따의 사례로 연관 지어서 생각해보면 이 온도 차는 쉽게 이해될 수 있다. 왕따는 그 누구도 자신을 괴롭히지 않는 상황에서도 정신적 피해와 두려움을 느낀다. 하교한 상황에서도 내일 등교를 걱정하고 타인이 불편해 할 만한 행동을 모두 계산하며 심리적인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피해는 존재하지만, 그 어떤 가해도 존재하지 않는 순간이 있을 수 있다.
이게 여성 차별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당사자가 아닌 남성들은 더더욱 이 소극적 차별에 자신이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기 어려운 구조에 있다. 그렇기에 여성과 남성의 성차별에 대한 인식이 다른 것이다. 사람들과 일조했던 명절의 성차별적 전통이 많이 줄어가고 있다고 해서, 여성차별이 해결되어 가고 있는 것인가?
잘못된 과거를 단순히 덮어두고 없애버리며 더 이상 이 현상이 없다고 치부해버려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에는 또다시 새로운 차별의 현상들을 자리잡게 할 것이다. 과거와 전통을 바탕으로 미래를 위해 논의하고 나아가야 할 때다.